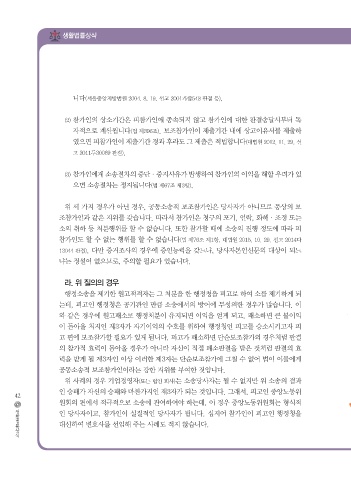Page 44 - 월간붓다 2018년 05월호 (Vol 363호)
P. 44
생활법률상식
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1가합548 판결 등).
(2)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에 종속되지 않고 참가인에 대한 판결송달시부터 독
자적으로 계산됩니다(법 제396조). 보조참가인이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
였으면 피참가인이 제출기간 경과 후라도 그 제출은 적법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
고 2011두30069 판결).
(3) 참가인에게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참가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
으면 소송절차는 정지됩니다(법 제67조 제3항).
위 세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상의 보
조참가인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은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조정 또는
소의 취하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가할 때에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
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76조 제1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
13044 판결). 다만 증거조사의 경우에 증인능력을 갖느냐, 당사자본인신문의 대상이 되느
냐는 정설이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위 질의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적격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
는데, 피고인 행정청은 공기관인 만큼 소송에서의 방어에 무성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와 같은 경우에 원고패소로 행정처분이 유지되면 이익을 얻게 되고, 패소하면 큰 불이익
이 돌아올 처지인 제3자가 자기이익의 수호를 위하여 행정청인 피고를 승소시키고자 피
고 편에 보조참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피고가 패소하면 단순보조참가의 경우처럼 판결
의 참가적 효력이 돌아올 경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패소판결을 받은 것처럼 판결의 효
력을 받게 될 제3자인 이상 이러한 제3자는 단순보조참가에 그칠 수 없어 법이 이들에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는 강한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기업경영자(또는 법인 회사)는 소송당사자는 될 수 없지만 위 소송의 결과
인 승패가 자신의 승패와 마찬가지인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중앙노동위
42 42
원회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적
률 상 식 법 생 활
인 당사자이고, 참가인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심지어 참가인이 피고인 행정청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