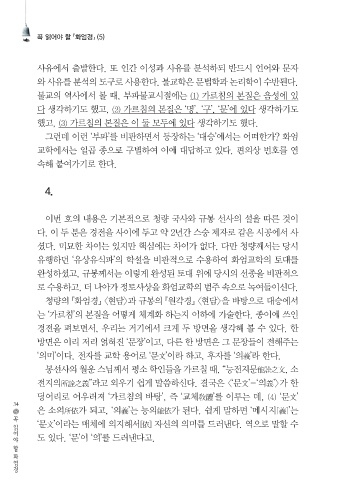Page 34 - 월간붓다 2020년 6월호 (Vol 388호)
P. 34
꼭 읽어야 할 『화엄경』 (5)
사유에서 출발한다. 또 인간 이성과 사유를 분석하되 반드시 언어와 문자
와 사유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한다. 불교학은 문법학과 논리학이 수반된다.
불교의 역사에서 볼 때, 부파불교시절에는 (1) 가르침의 본질은 음성에 있
다 생각하기도 했고, (2) 가르침의 본질은 ‘명’, ‘구’, ‘문’에 있다 생각하기도
했고, (3) 가르침의 본질은 이 둘 모두에 있다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부파’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대승’에서는 어떠한가? 화엄
교학에서는 일곱 종으로 구별하여 이에 대답하고 있다. 편의상 번호를 연
속해 붙여가기로 한다.
4.
이번 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청량 국사와 규봉 선사의 설을 따른 것이
다. 이 두 분은 경전을 사이에 두고 약 2년간 스승 제자로 같은 시공에서 사
셨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핵심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청량께서는 당시
유행하던 ‘유상유식파’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화엄교학의 토대를
완성하셨고, 규봉께서는 이렇게 완성된 토대 위에 당시의 선종을 비판적으
로 수용하고, 더 나아가 정토사상을 화엄교학의 범주 속으로 녹여들이신다.
청량의 『화엄경』 <현담>과 규봉의 『원각경』 <현담>을 바탕으로 대승에서
는 ‘가르침’의 본질을 어떻게 체계화 하는지 이하에 기술한다. 종이에 쓰인
경전을 펴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크게 두 방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방면은 이리 저리 얽혀진 ‘문장’이고, 다른 한 방면은 그 문장들이 전해주는
‘의미’이다. 전자를 교학 용어로 ‘문文’이라 하고, 후자를 ‘의義’라 한다.
봉선사의 월운 스님께서 평소 학인들을 가르칠 때, “능전지문能詮之文, 소
전지의所詮之義”라고 외우기 쉽게 말씀하신다. 결국은 <‘문文’-‘의義’>가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 ‘가르침의 바탕’, 즉 ‘교체敎體’를 이루는 데, (4) ‘문文’
34
은 소의所依가 되고, ‘의義’는 능의能依가 된다. 쉽게 말하면 ‘메시지[義]’는
꼭
읽어야
‘문文’이라는 매체에 의지해서[依] 자신의 의미를 드러낸다. 역으로 말할 수
도 있다. ‘문’이 ‘의’를 드러낸다고.
할
화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