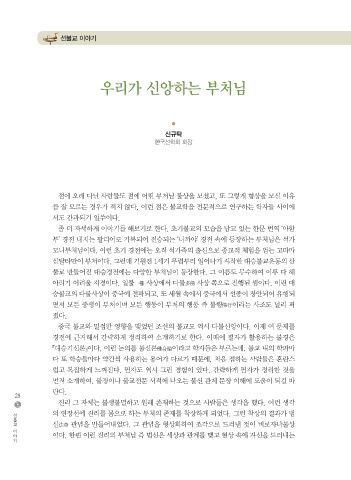Page 30 - 월간붓다 2018년 11월호 (Vol 369호)
P. 30
선불교 이야기
우리가 신앙하는 부처님
●
신규탁
한국선학회 회장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절에 어떤 부처님 불상을 모셨고, 또 그렇게 형상을 모신 이유
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은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서도 간과되기 일쑤이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초기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한문 번역 ‘아함
부’ 경전 내지는 팔리어로 기록되어 전승되는 ‘니까야’ 경전 속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석가
모니부처님이다. 이런 초기 경전에는 오직 석가족의 출신으로 종교적 체험을 얻는 고따마
싣달타만이 부처이다. 그런데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대승불교운동의 산
물로 만들어진 대승경전에는 다양한 부처님이 등장한다. 그 이름도 무수하여 이루 다 헤
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일불一佛 사상에서 다불多佛 사상 쪽으로 진행된 셈이다. 이런 대
승불교의 다불사상이 중국에 전파되고, 또 세월 속에서 중국에서 선종이 창안되어 유행되
면서 모든 중생이 부처이며 모든 행동이 부처의 행동 즉 불행佛行이라는 사조도 널리 퍼
졌다.
중국 불교와 밀접한 영향을 맺었던 조선의 불교도 역시 다불신앙이다. 이제 이 문제를
경전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이때에 필자가 활용하는 불경은
『대승기신론』이다. 이런 논의를 불신론佛身論이라고 학자들은 부르는데, 불교 내의 학파마
다 또 학승들마다 약간씩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혼란스
럽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필자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간략하게 필자가 정리한 것을
먼저 소개하여, 불경이나 불교전문 서적에 나오는 불신 관계 문장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
란다.
28 28
진리 그 자체는 불생불멸하고 원래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
교 선 불
의 연장선에 진리를 몸으로 하는 부처의 존재를 착상하게 되었다. 그런 착상의 결과가 법
이 기 야 신法身 관념을 만들어내었다. 그 관념을 형상화하여 조각으로 드러낸 것이 비로자나불상
이다. 한편 이런 진리의 부처님 즉 법신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현상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